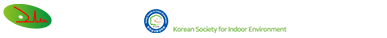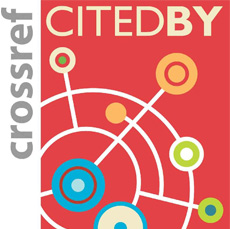1. 서 론
대기오염은 현대 사회에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평가된다(Sokhi et al., 202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매년 전 세계적으로 400만명 이상이 조기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WHO, 2024). 특히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초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 mm in aerodynamic diameter, PM2.5)는 다양한 노출방식(exposure route)으로 사람의 건강에 잠재적인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Kang et al., 2024). 선행연구에 따르면 PM2.5는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발병률에 강한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만성 노출 시 유병률 및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chwartz et al., 2021;Han et al., 2019). 또한, PM2.5의 농도가 10 μg/m3 상승에 따라 심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의 위해도가 약 10%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Kim et al., 2003).
국내에서는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위해를 인지하고 대기환경기준을 제정하였고, 2005년부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Air korea)를 통해 실시간 대기오염도 정보를 제공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Woo et al., 2024). 또한, 2008년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공포하여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발전소 소각장 등 건강영향평가 매뉴얼에 제시된 방법론을 기반으로 인체 건강영향을 예측 및 평가하고 있다(MOE, 2010).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경우 다양한 배출원으로 인해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고 노출될 수 있고, 장기간 만성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잠재적인 건강위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ang et al., 2020).
대기오염은 발전소와 공장과 같은 산업시설, 폐기물 소각로와 같은 점오염원과 차량의 내연기관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등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다(Lai et al., 2016). 대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와 분포는 온도, 습도, 강수량, 풍속, 기압과 같은 기상학적 요인과 인구 밀도를 포함한 지리적 특성 등 다양한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Sun et al., 2019). 따라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을 식별하는 것은 오염의 발생과 형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며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Maji and Sarkar, 2020).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시· 공간적 변화를 야기하는 다양한 환경 요인을 식별하는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ME, 2025). 특히 간접적인 노출평가 방법인 환경 모니터링(environment monitoring), 노출 모델링(exposure modeling), 설문지(questionnaires)를 활용하여 주변의 환경요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노출량과 건강영향을 비교 및 검증할 수 있다(Guak and Lee, 2022). 대기, 수질, 토양 문제에 대한 환경 인식은 환경문제 해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지역 주민의 환경 인식도와 실제 생활환 경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다양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Kim, 2011;Kim and Kang, 2016).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건강영향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다각적 접근법을 통해 노출지역(반월동)과 대조지역 간 차이를 평가하여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환경 인식도와 건강영향 간 상관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여 향후 지역맞춤형 환경관리 및 건강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설문조사)
본 연구는 환경부의 수행결과로서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 3곳의 민원의 시초로 담당과(환경)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과거 연구진에서 수행한 출생코호트 대상자 중에 천식 환자를 중심으로 섭외를 실시하였으며, 반월동의 사업장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측정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2021년에 실시하였으며, 건강지표는 2023년 반월동 중심으로 실시한 결과로서 환경오염에 대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였고, 설문내용으로는 지역주민의 환경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은 지역주민 35명과 산업단지 주변 거주민 17명으로 총 52명이 었으며, 설문조사에는 3개 사업장 주변에서 협조가 가능한 지역주민 20명(남성 15명, 여성 5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환경 인식도를 평가하기 위한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설문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평가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1부터 5점(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아니다)으로 평가하였다.
2.2 시료채취
실내 대기 중 미세먼지(PM10, PM2.5) 및 온도와 습도의 측정은 레이저 광산란법 직독식 측정기인 DT- 9881M (SANE Cal. Co., Ltd., Korea)을 사용하였다. 측정 대상은 지역주민 35명과 산업단지 주변 거주민 17명을 선정하였다. 측정 지점은 단위세대의 거실과 주로 사용하는 방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고, 중앙부 벽으로부터 최소 1 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바닥면으로부터 1.2~1.5 m 높이에서 실시하였다. PM10와 PM2.5의 농도는 10분씩 3회 측정 후, 평균 농도를 기록하였다. 측정 에 사용된 기기의 사양은 Table 1과 같다.
2.3 건강보험공단자료 코호트를 이용한 조사 방법
본 연구의 표본 수가 적은 주민 코호트로 확인 및 단시간에 만성질환에 대한 역학적인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어 건강영향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산단 지역별 코호트(cohort)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프로토콜(protocol)은 경기도 안산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출한 맞춤형 DB 전체에서 거주력과 사망일자로 사망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코호트 입적일은 2010년 이후 연도별 실거주지 코드가 노출지역과 대조지역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거주한 해의 1월 1일로 하고, 코호트 탈적일은 노출과 대조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연도 별 실거주지 코드가 바뀌는 해의 전년 12월 31일로 마지막 관찰연도를 추적하였다.
만성질환의 발생일자는 코호트 시작 이후 해당 만성 질환의 상병코드로 발행된 명세서의 요양 개시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로 하였다. 집계 대상 명세서는 한방 명세서를 제외한 의과, 치과, 약국 명세서를 참고치로 추출하였다. 만성질환 발병유무에 대한 기준은 조사지역과 대조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대상자의 그다음 해의 1월 1일을 입적일로 하여 질환의 발생일은 주상병과 부상병(제1부상병)이 외래 2회 이상 또는 입원 1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를 최초 발생일로 하였다. 코호트에서 관찰을 종료하는 기준은 노인중심의 대상자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이사, 사망 등) 상실한 전 연도의 12월 31일이며, 대상자가 입적일(index date) 이전의 기간 동안에 해당 만성질환이 발생한 경우 질환 발생일을 적용하였다.
맞춤형 DB 추출은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웹 페이지(https://nhiss.nhis.or.kr)를 통하여 맞춤형 DB 추출을 요청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건강보험에 대한 진료명세서와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 내역 등을 기존 청구일 중심에서 진료개시일 중심으로 자료구조를 조정한 DB를 활용하였다. 이는 자격 DB, 진료 DB 및 검진 DB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전향적 코호트 연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규모 DB 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다. 추출 대상 인원은 2002년 부터 2022년까지(2002년~2006년의 비 안정화 자료를 제외한)의 연도별 실거주지 코드가 경기산업단지 조사 지역과 대조지역에 해당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요청한 정보는 자격 DB(성별, 연령, 거주지, 소득 등), 사망 DB(사망일자), 명세서 DB(상병코드, 요양개시일자 등)를 추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환경 인식도 평가
환경 인식도 평가에 참여한 대상자는 단순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넘어 대상지역의 육·가공 및 비료의 산업장의 악취 문제로 민원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는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질오염(p=0.0039)과 토양오염(p=0.007)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다. 반면, 대기오염, 악취. 소음 및 진동, 폐기물, 산업단지 주변지역 환경오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항목에서는 성별 간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p>0.05).
3.2 실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측정시점은 7월부터 12월에 진행하였으며, 농도 및 온·습도 측정을 하기 전에 청소 및 환기를 평상시의 생활환경의 조건으로 진행을 당부하여 측정에서 특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며, 대상자의 실내 거주에 따른 사전 섭외에 최근 1년간의 리모델링 및 공기청정기 등의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실내 52가구의 평균 실내 온도는 23.78±1.86℃로 나타났고, 산업단지 주변 거주민의 평균 실내 온도(23.83±2.48°C)가 지역 주민의 평균 실내 온도(23.75±2.48°C)보다 높았다. 실내 52가구의 평균 습도는 35.59±10.26%였으며, 실내 온도와 동일하게 산업단지 주변 거주민의 평균 습도(37.52±9.46%)가 지역주민 평균 습도(34.37±10.7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PM10의 평균 농도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거주민(23.28±10.20 μg/m3)이 지역 주민(19.59±8.22 μg/m3)보다 높았으며, PM2.5에서도 동일하게 산업단지 주변 거주민(9.82±4.12 μg/m3)이 지역 주민(8.39±4.30 μg/m3)보다 높았다. PM10과 PM2.5는 각각 연간 기준치(PM10: 50 μg/m3, PM2.5: 15 μg/m3)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3 반월동 만성질환 코호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결과
반월동 전체 대상자는 노출지역(반월동) 171,300명, 대조지역(정왕본동, 정왕동, 원곡본동, 원곡동, 초지동, 고잔동 등의 밀집 지역) 283,312명으로 총 454,612명 이었다. 노출지역과 대조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을 chisquare test로 비교한 결과, 성별, 연령 분포, 그리고 소득 수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노출지역에서 남자 91,614명(53.48%), 여자 79,686명(46.52%)이었고, 대조지역에서 남자 143,066세(50.50%), 여자 140,246명(49.50%)으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1). 연령 분포에서도 두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001), 특히 20~40세 연령대의 비율이 노출지역(33.69%)에서 대조 지역(26.84%)보다 높았다. 소득 수준의 분포 또한 두 지역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p=0.0001), 노출지역에서는 3분위 소득층(35.01%)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조지역에서는 4분위 소득층(28.82%) 비율이 노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반월동 만성질환별 코호트 대상자의 발병 현황은 Table 5와 같고, 발생률은 총 관찰 인년에서 새롭게 질병이 발생한 수의 분율로 평균 발생률(incidence density)을 산출하였다. 호흡기 질환 중 급성 상기도 질환의 발병은 노출지역 15,189명(57.05%), 대조지역 23,961명(52.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의 발병은 노출지역 25,429명(47.03%), 대조지역 36,108명(43.1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기타 급성 상기도 질환의 발병은 노출지역 74,950명(74.58%), 대조지역 128,434명(74.71%)으G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510). 천식의 발병은 노출지역 129,659명(93.87%), 대조지역 200,437명(90.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01).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민원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산시 반월동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및 건강영향을 분석하였다. 52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와 온·습도를 측정하였으며, 과거 질환이 있는 대상자의 220명 중 동의를 받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환경 인식도에 대해 평가 하였다. 또한, 만성호흡기 질환 발병 현황에서 노출지역이 대조지역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5점 리커트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환경 인식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설문결과 수질오염(p=0.0039) 및 토양오염(p=0.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환경 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p=0.0524). 또한, 주변의 노출에 따른 인식중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도로의 존재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심리적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로 경향성이 확인되었다(p=0.0524). 다양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환경 인식도와 건강 및 심리적 영향 간의 잠재적 연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et al., 2018;Lee, 2019).
실내 52가구의 평균 실내 온도는 23.78±1.86°C, 습도는 35.59±10.26%, PM10은 21.01±9.10 μg/m3, PM2.5 에서는 8.94±4.24 μg/m3로 측정되었다. PM10과 PM2.5 는 각각 연간 기준치(PM10: 50 μg/m3, PM2.5: 15 μg/ m3)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구 대상 지역의 실내 환경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월동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2008년을 시작 시점으로 하여 23개의 만성질환에 24개의 암 질환에 대해 5년간의 추적 등의 wash-out을 구축한 자료를 적용하여 코호트를 dynamic cohort로 주상병 코드와 부상병 코드를 적용하여 코호트를 구축하였다 (AGEC, 2021).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노출지역 대비 대조지역과 각각에서의 호흡기 만성질환 보정(공변수)을 통해 유무에 따른 연령, 성별, 소득을 도출을 통해 결과를 만들었다. 반월동 전체 대상자는 노출지역(반월동) 171,300명, 대조지역(정왕본동, 정왕동, 원곡본동, 원곡동, 초지동, 고잔동 등의 밀집 지역) 283,312명으로 총 454,612명이었다. 노출지역의 성별 분포는 남성 91,614명(53.48%)과 여성 79,686명(46.52%)으로 나타났으며, 대조지역에서는 남성 143,066명(50.50%), 여성 140,246명(49.50%)으로 조사되었고, 두 지역 간 성별 분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01). 연령 분포에서도 두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p=0.0001), 특히 20~40세 연령층의 비율이 노출지역(33.69%)에서 대조 지역(26.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성별 분포를 통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남성 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연령 분포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연령층의 거주 비율이 높아 환경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잠재적인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Bang et al., 2020). 반월동 만성질환별 코호트 대상자의 발병 현황에 따르면, 반월동 만성질환의 발병 현황 중 호흡기 질환 중 급성 상기도 질환의 발병은 노출지역 15,189명(57.05%), 대조지역 23,961명(52.8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기타 상기도 질환의 발병과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의 발병은 노출지역과 대조지역에 유의미한 결과로서 확인되었으며, 천식의 발병은 노출지역 129,659 명(93.87%), 대조지역 200,437명(90.5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호흡기 질환 발생률에서는 급성 상기도 및 하기도 감염, 그리고 천식의 발병률이 노출지역에서 대조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는 노출지역의 환경적 요인이 특정 호흡기 질환 발생에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환경성 질환 중 호흡기 질환은 5년 이상의 거주환경의 노출 대상자가 건강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출지역과 대조지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요인의 차이를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지역 맞춤형 환경 정책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광산란 방식의 직독식 장비(DT-9881M)를 사용하여 PM2.5와 PM10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공인된 중량법이나 β선 흡수법과 비교했을 때 주변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가 20명으로 통계적 신뢰성이 비교적 제한적으로 판단되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